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근교, 만레사에서 중세거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전시관에 궁금해서 들렀다. 만레사의 정치인이 정책적으로 이 소도시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고 들었다. 물론 전시관의 이쁘장한 안내원의 친절한 영어설명을 이해한 것이니 대충 그렇게 알아들은 것이다. 만레사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다고 한다. 500여년된 거리가 온전하게 살아남은 이유는 지하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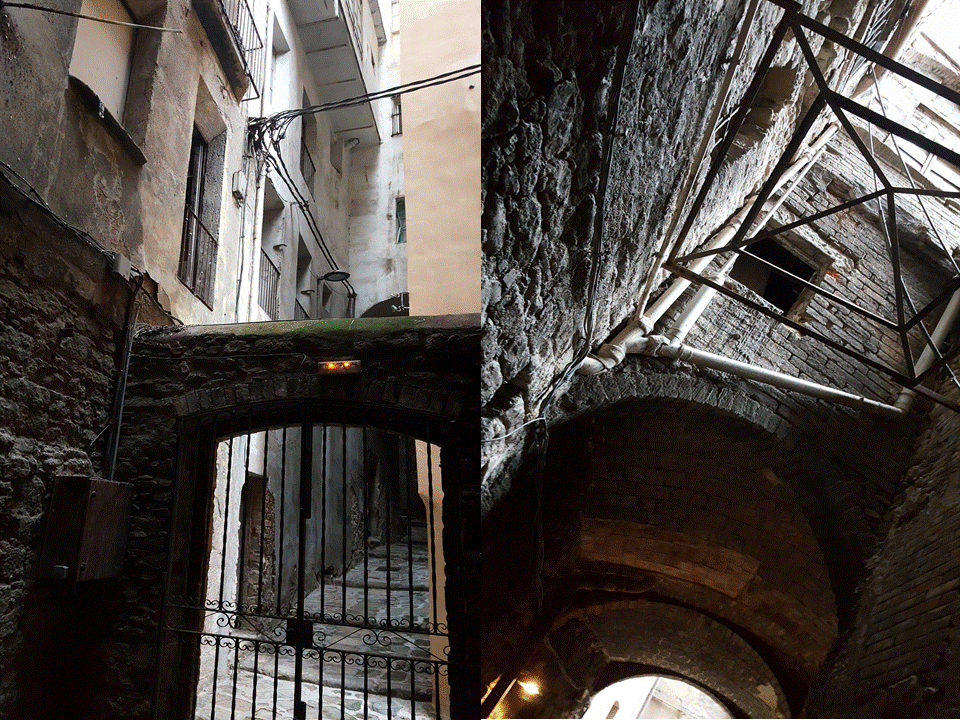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만레사의 건물들은 새로지어진 건물들에 고대 건물의 흔적이 덧붙여져 있다. 반대로된 표현이 맞지만 나는 현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바라본 과거의 흔적은 지금에 덧붙여진 무늬일 뿐이다. 도시 곳곳마다 건물 벽의 경계면에 구시대와 신시대의 흔적을 벽면을 통해서 살필수 있다.
전시관의 이 거리가 박제화된 것이 아쉽다. 화마(火魔)가 지나가고 남은 잿더미의 산에서는 생명이 재빠르게 일어나 다시 분주해진다. 그리고 생기가 다시 넘쳐난다. 그러나 인간의 거리는 전통이란 이름으로 온전하게 보존된다. 그리고 소량의 삥을 뜯는다. 고고참 인간종자의 잔머리란! 자린고비 구두쇠는 현찰을 장농속에 콕 쟁여놓는다. 돈은 유통되야 하는데,

항구도시 제노아(이태리)의 이 거리도 500여년이 지났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다. 이 거리를 걷고 있는 500여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옷차림만 바뀌었을 뿐이다. 아무도 없는 빈공간의 거리와 왁자지껄 떠들고 너저분하기까지한 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거리의 생명
